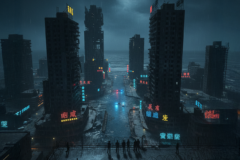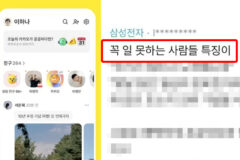‘판의 미로’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은 왜 크리처에 집중하나 “우리 삶은 고통”

“제 영화는 불완전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세상은 이분법적이잖아요. 100% 좋은 것과 100%의 나쁜 것만 있는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한쪽에 치우치면 우리에겐 산소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사실 우리 모두는 (양 극단이 아닌)가운데에 존재합니다.”
크리처물로 대표되는 장르영화의 거장인 멕시코 출신의 영화 감독 기예르모 델 토로는 극과 극으로 치닫는 세상을 우려하면서 각자 처한 상황과 시간,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침에는 성자였다가 밤에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오후 2시에는 아버지였지만 오후 5시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도 된다”며 “변화하는 모습을 왜 용서하지 못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다름과 변화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일은 감독이 영화를 만들 때 늘 생각하는 주제다.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이 새 영화 ‘프랑켄슈타인’으로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았다. 갈라 프레젠테이션 부문에 초청된 영화를 소개하기 위한 첫 내한이다. 올해 30주년을 맞는 영화제를 찾은 영화인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감독으로 공식 상영마다 팬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특히 18일 열린 첫 공식 상영 때는 극장을 찾은 380여명의 관객에게 전부 사인을 해주는 팬서비스로 화제가 됐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프랑켄슈타인’은 그동안 드라마와 영화 등으로 여러 차례 만들어진 메리 셸리의 동명 고전을 감독의 스타일로 다시 창조한 작품이다. 19세기 중반 천재 과학자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죽은 시체에 생명의 불꽃을 불어넣는 실험을 통해 피조물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그동안 ‘판의 미로’를 시작으로 ‘셰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 애니메이션 ‘기예르모 델토로의 피노키오’까지 크리처물에 집중하면서 기상천외한 장르 영화의 세계를 구축한 감독인 만큼 이번 ‘프랑켄슈타인’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만난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은 ‘프랑켄슈타인’에 대해 “모든 것이 집약된 오페라처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세트나 미술도 스토리가 됩니다. 단순한 눈요기가 아니라 관객에게 눈의 영양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품과 캐릭터까지 모든 걸 분리하지 않고 연결했어요. 크리처는 새롭게 태어난 신생아처럼 영혼의 모든 것을 넣었어요. 의상의 직물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섬유를 새롭게 만들어 사용했고요. 이 영화에는 많은 거울이 나오는데 그걸 통해 순환을 이야기하고자 했어요.”

감독의 영화에는 늘 괴수가 등장한다. 초기작인 ‘미믹’에는 기괴한 괴수가 인간들을 위협하고, ‘판의 미로’는 전쟁의 비극과 크리처 장르물을 뒤섞은 독창적인 이야기로 사랑받았다. 아카데미 작품상을 안긴 ‘셰이프 오브 워터’는 실험으로 태어난 괴생명체와 한 여인의 편견과 혐오를 뛰어넘는 사랑을 그렸다. 감독은 사랑과 포용을 이야기하면서 왜 크리처물에 집중할까.
“TV 매체나 상업적인 작품들을 보면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 삶은 고통으로 가득하죠. 완벽하지 않아요. 괴물들도 완벽하지 않죠. 인간의 어두운 면을 대변하기도 해요. 그런데 한편으론 비범해요. 상징성이 큰 존재에요. 저는 완벽하지 않은 쪽에 더 눈이 가요. 괴수는 사회와 정치, 종교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상징이 되기도 하고요.”
감독의 시선은 한국의 괴수들에게도 향하고 있다. 특히 19일 열린 기자회견에는 곽재식 작가의 책 ‘한국 괴물 백과’를 한 손에 들고 참석해 대화 도중 책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이어 “한국의 괴수들을 좋아한다”며 “물론 한국의 신화를 완벽하게 모르면 괴수들을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멕시코처럼 한국도 자연의 모든 것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비슷한 것 같다. 제대로 완벽하게 안다면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프랑켄슈타인’은 오는 11월7일 전 세계에 동시 공개된다. 감독은 “보통 필모그래피(작품 목록)라는 말을 쓰지만 제가 만든 영화는 저의 바이오그라피(전기)”라며 “감독들이 영화를 만드는 이유는 잘하는 일이 오직 영화 만드는 일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감독은 보통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소홀할 때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신경쓰지 않고 고통을 겪으면서 내놓는 결과물인 영화는 완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